게티즈버그의 기억과 호국보훈의 의미
보훈 정신이야말로 국가의 불멸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링컨은 역설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을 들라면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Gettysburg Address)을 떠올릴 수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1월 19일, 링컨은 전몰자 국립묘지에 봉헌된 게티즈버그를 방문해 그 유명한 연설을 남겼다. 비록 2분간의 짧은 연설로 266단어에 불과했던 연설이 시대의 풍상을 이겨내고 우리 곁에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연설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절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기억할 것이다. 사실 국민의 정부가 주권자를 정의한다면 국민에 의한 정부는 통치의 주체를 규정한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언표를 통해 통치의 목적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임을 밝혀 놓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간명하고 본질적인 민주주의의 정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만약 이 연설의 원문을 읽어 본 사람이라면 핵심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한 찬가(讚歌)라는 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게티즈버그는 “조국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로 봉헌되고 있으며,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땅이 신성하게 축성(祝聖)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링컨이 말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그 다음 구절이 아닌가 한다. “용감한 이들이 (조국을 위해) 여기서 수행한 일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으로 남겨진 일을 수행하는 데 봉헌해야 할 사람들은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 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大義)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결코 헛되이 죽어 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결연한 추모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게티즈버그 연설에 견줄 만한 유일한 비교 사례는 아테네 페리클레스(Periclers)의 추모연설을 꼽을 수 있다.
페리클레스 연설이 아테네 시민들의 결연한 투쟁정신을 드러내는 데 있다면, 이에 비해 링컨의 연설은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링컨은 조국을 위해 죽어 간 이들이 남긴 미완의 과제를 살아남은 자들이 수행해야 하며, 그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강렬한 결의를 밝힌 것이다.
다시 맞이한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우리는 링컨의 연설을 기억하며 어떤 결의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혹은 치유할 수 없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추모와 보훈의 결의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는 그들이 끝내지 못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어떤 결의와 의지를 갖고 있는가? 보훈의 정신이야말로 국가의 불멸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링컨은 역설했던 것이다. 보훈이 곧 국가안보임을 천명했던 게티즈버그 연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본다.(http://kookbang.dema.mil.kr/)
윤영미 교수(평택대 외교안보전공)
- 관련기사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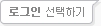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