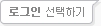"창설 40주년 맞은 향토예비군 재편 방안"
노후무기 교체, 관련 법령 정비 절실
고려·조선의 예비군 제도
永世中立國(영세중립국) 스위스에 가보면 곳곳에 防空壕(방공호)와 戰鬪壕(전투호)가 구축되어 있고, 집집마다 전투장비를 갖추고 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스위스의 이러한 戰備(전비)태세에 기세가 눌려 침략야욕을 접어야 했다. 우리나라에도 오래 전부터 향토방위의 전통이 있어 왔다. 고구려 시대에는 扃堂(경당), 고려 시대에는 光軍(광군)과 같은 예비군 조직이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民堡(민보)제도가 있었다.
조선 高宗(고종)때 병조판서를 역임한 申觀浩(신관호)는 「民堡輯說(민보집설)」에서 「外船(외선)의 빈번한 침입에 대비해 자기 고장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종래의 民堡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민보도 군대다. 군대와 같이 반드시 절제가 있어야 한다(民堡亦軍施也 軍施順節制)면서 「지략과 용맹이 있는 자를 지휘자로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36년간의 日帝(일제)식민통치를 겪고 난 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지만, 6.25 전쟁과 戰後(전후)복구라는 어려움 속에서 豫備戰力(예비전력) 건설까지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려웠다. 1961년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마련할 만큼 일찍부터 예비戰力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현실이 따라 주지 못했다.
1960년대 후반 1.21사태나 울진·삼척지구무장공비사건 등을 겪으면서 예비戰力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1968년 2월 7일 朴正熙(박정희) 대통령은 경전선 개통식에서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는 향토방위 태세의 정비를 위한 250만 在鄕軍人(재향군인)의 무장」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1일 「향토예비군」을 창설했다. 향토예비군을 창설함으로써 우리는 60만 常備戰力(상비전력) 외에 경제적인 방법으로 수백만의 예비戰力을 확보, 敵(적) 특수전 부대에 의한 非정규전이나 속전속결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예비군 450만에서 300만으로 감축
예비군 제도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창설 초기에는 軍은 예비군에 대한 지휘권을 경찰은 교육훈련권을 갖고 있었으나, 1971년부터는 군이 지휘와 교육훈련을 맡고 있다. 1970~1980년대에 예비군 제도는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 체제로 운영됐다. 아마 「7080세대」들은 행정구역 단위의 예비군 읍·면·동대와 기동대라는 명칭이 귀에 익을 것이다. 1993년 연천 예비군 훈련사고 이후 예비군 제도는 「동원예비군」과 「鄕防(향방)예비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무제도가 연령제에서 年限制(연한제)로 변경되면서 예비군 병력은 450만 명에서 300만명으로 감축됐다. 예비군 훈련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1999년에는 전역 1년차와 8년차의 훈련을 면제시켜 주고, 2~7년차는 훈련기간을 차등 조정하는 한편, 동원훈련기간은 3박4일로 환원했다.
2004년 이후에는 1~4년차 동원예비군은 戰時(전시) 수행절차에 따라 부대 증·창설부터 임무수행까지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받게 했다. 5~6년차는 훈련기간을 줄였으며, 7~8년차는 기본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국방개혁 2020」 계획에 의하면 현재 300여만 명의 예비군은 연차적으로 감축돼 150만 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국방개혁 2020」의 총 소요예산 621조원 중 예비戰力과 관련된 예산은 6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하다. 상비군의 戰力증강이 시급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는 예비전력의 유지·강화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사회변화에 따라 종래의 예비군 제도는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예비군 자원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농촌에서는 예비군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행정의 중심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옮겨지고, 종래의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예비군 부대도 시·군·구 단위로 새로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
직장 예비군 부대의 경우, 기업 구조 조정 및 자동화, 기업들의 신규사원 채용기피와 비정규직 운용 등으로 인해 예비군 자원이 감소하면서 부대 해체 및 梯隊(제대) 격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반영하는 예비군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
노후무기 교체 시급
현재 예비군 훈련은 신분별·연차별·동원지정 여부 등에 따라 훈련체제가 복잡하다. 개인별 훈련수준, 개인희망, 훈련일정 등 예비군의 개별여건 및 편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자가 약 16만명(전체의 5%)에 이르러 훈련의무 형평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 훈련을 단순화하고, 훈련 보류자를 최소화해 훈련의무 형평성을 提高(제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이버 원격교육 시행, 훈련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휴일 및 야간 훈련시행, 통합 예비군 훈련장 활용, 과학화 장비 활용 등 교육훈련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노후화한 예비군 무기 및 장비들을 교체하는 것이다. 지금 현역 병사들에게는 기본 화기로 K-2 소총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예비군들에게 지급되는 화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단 카빈 소총과 40여 년 전 필자가 베트남戰에 참전할 당시 지급되기 시작한 M16A1 소총이 반반이다.
필자는 한 예비군으로부터 『예비군 훈련 때 카빈 소총이 작동하지 않아 옆 사람의 총을 빌려 사격을 마쳤다. 그런 소총을 들고 강릉 무장공비침투 차단작전에 투입되었다면 나는 총도 못 쏴 보고 죽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또 다른 예비군은 『예비군 훈련 때 한국전쟁 때 쓰던 카빈 소총을 들고 방독면과 방탄 헬멧도 없이 「돌격 앞으로」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예비군 관련 법령 정비 필요
예비군 동원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1984년 제정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은 이름과는 달리 平時(평시)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戰時운용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平時를 상정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민방위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戰時상황을 상정한 「戰時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이나 긴급명령 등을 통합해 戰·平時 공히 사용할 수 있는 법령체제(가칭 「동원기본법」)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軍內 女軍(여군)의 비중이 2020년까지 장교 정원의 7%, 부사관 5%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여성의 예비군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토예비군은 不惑(불혹)의 나이에 들어섰다. 예비戰力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우리 軍과 사회는 그동안 예비군에 대해 너무 무관심 했다. 사회의 변화와 미래 작전환경에 맞도록 예비군 제도를 개선하고, 예비군 戰力을 강화하기 위한 軍과 사회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konas)
김 명 세(육군협회사무총장 겸 지상군연구소장)
* 이 글은 월간조선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관련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