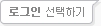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미국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
정부는 중국의 해양패권 음모를 직시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동참을 주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국몽이 지난달 19~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시 주석은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중국을 2050년까지 종합 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세계의 선두에 서는 ‘현대화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시진핑 집권 2기의 개막을 알리는 당대회에서 미국과의 국력경쟁을 예고하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5년 전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될 당시 제시한 ‘중국의 꿈(中國夢)’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기도 하다. 시 주석이 수없이 언급해 온 ‘중국의 꿈’은 ‘강국의 꿈(强國夢)’과 ‘강군의 꿈(强軍夢)’과 동의어임이 분명하다.
시 주석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서 강군건설 전략에 비교적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시 주석은 “2020년에 기계화와 정보화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룬 뒤 2035년에는 국방·군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050년에는 세계 일류 군대가 전면적으로 건설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대는 싸울 준비를 갖추고 싸워 이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보망에 기반한 합동작전 능력 향상, 지속적인 군·국방 개혁 등을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런 구상과 계획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국은 1982년경에 국방전략(해상방어선)으로 ‘도련선(島鏈線, Islands Chain)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다. 태평양의 섬(島)을 사슬(鏈)처럼 이은 가상의 선(線)으로, 중국 해군의 작전 반경을 뜻한다. 도련선 밖으로 미군 전력을 축출하고 통제한다는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서해안~오키나와~대만~필리핀~남중국해를 연하는 선으로 2020년경까지 달성하고, 제2도련선은 일본 동해안~오가사하라~괌~파푸아뉴기니를 연하는 선으로 2050년경까지 달성 목표다. 국제법을 무시한 중국의 해양패권 전략이다. 제1도련선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계획은 시진핑 시기를 연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 구체화되었다.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해양자원 개발, 해양경제 발전, 해양권익 보호, 해양강국 건설 등 해양과 관련한 언급들이 대폭 강화되었다. 해·공군력과 같은 전력증강에 의해 이러한 권익을 확고히 보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해군과 공군력 증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남중국해 산호초 점령 및 불법 군사기지화, 이어도 관할권 주장,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60~80% 주장, 센카쿠열도 영유권 주장, 이어도 주변 및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했다. 중국은 목표달성을 위해 러시아와 해상 연합훈련을 매년 동해. 서해, 중국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이 한반도 무력적화통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취임직후부터 미국에 대국관계 설정을 요구해왔고, 8일 북경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국관계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시 주석은 지난 4월 워싱턴DC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은 수천 년간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바 있다. 중국이 방어무기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도련선 전략과 연관되어서다. 사드가 없으면 주한미군은 북한 핵미사일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때문에 결국 철수해야 할 것이다. 중-러는 또 북한 핵무장을 지원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중국의 도련선 음모를 저지하지 못할 경우 큰 안보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국은 해상교통로가 중국에 의해 차단되어 국가생존이 어렵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경우 북한에 의해 공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이런 음모를 일찍부터 간파하고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자유항행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해군 전력의 60%를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기로 했다. 일본 함정이 이 작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과 인도는 일본과 같이 주기적으로 다국적 해군 연합훈련(Malabar)을 일본근해와 인도양에서 실시해오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2017.1)후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에 대항하기 위해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이란 개념 대신, 인도까지 포함해 해양세력이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한다는 개념이다. 인도 측에서 일본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지난 2007년 처음 쓴 용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동경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한·미 정상회담(서울)에서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임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참여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의 해양패권 음모를 직시하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은 일찍부터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확대하여 한국, 아세안을 포함하는 아시아판 나토(NATO)형 안보기구 창설까지 구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동참을 주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한미동맹 약화는 물론 안보미아(安保迷兒)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중심으로 하는 다국적 안보기구 구성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미국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 전략’에 동참할 경우 ‘해상교통로 확보, 북핵 해결, 전쟁 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