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국군 ‘즉각 대응’의 딜레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이후 16,500개 이상의 무기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내며, 핵무기 고도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엔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이 포함됐다. 그는 쓰레기 풍선 살포·GPS 교란 공격·4.5t 미사일 도발·해킹·대남 방송·선전&선동(propaganda & agitation)을, 최근 중국은 군무원·CCTV 등으로 정보를 빼가는 등 불안감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7~8월 발표한 美 공화·민주당 강령엔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됐다. 이후 미국의 북핵 정책(전략)에 관한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국내외적 논박(論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8월 중국을 방문 간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기조와 의지’를 강조했다지만, 美 국가전략 1순위가 ‘중국 봉쇄(견제)·인도-태평양 전략’이고, 한반도는 2순위이기에 미덥지 않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9월엔 김정은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하며 美 대선판을 더 흔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워싱턴 정상 회담·선언,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회담 등에서 ‘핵 비확산체제(이하 NPT)’를 준수하고,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를 준수하겠다고 확약했다. 지난 7월엔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에 공동으로 서명하며 ‘논의·조율·전략자산 전개’ 등은 ‘핵 기반 동맹’으로의 격상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美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Vipin Narang)는 “美 핵 작전에 한국의 재래식 지원 조율”을 의미하며, “미국 주도의 핵 작전에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지원하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軍은 북한의 고강도 도발·핵무기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무력 행위로 간주하여 ‘도발 원점을 즉각 타격’한다는 단호한 응징계획과 군사적 타격방침을 정했다. 다만, 강한 의지(strong will)만으로 정치·사회·군사적 현실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다. 이같은 현실은 크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제 사회·정치적 측면에서 북한이 핵무기 고도화를 거듭되고 있음에도 중·러의 비호를 받고 있어 안보리 결의조차 할 수 없다. 러-우 전쟁의 발발은 북한의 대러 재래식 무기(포탄) 수출에 호재가 됐고, 군사 관계는 심화했으며, 핵·미사일과 관련한 첨단 기술을 이전받는 환경마저 마련됐다.
둘째, 지정학적 측면에서 2009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다.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는 북·중·러의 핵전력 증강에 따른 새로운 ‘핵 운용 지침(NEG)’을 발표했다. 이는 핵 공격을 억지 및 반격할 때만 사용한다던 미국의 ‘핵무기 단일 목적 사용’ 용도가 폐기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줬다. 더욱이 민주·공화당의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Rafael Grossi)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며 국제 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여러 사유로 인해 ‘북한 비핵화’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
셋째, 정책·전략적 측면에서 확증편향의 이데아(Idea)에 집착해서다. 미-소 쿠바 미사일 위기(1962) 이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1, 1972)-중거리핵전력 조약(INF, 1987)-전략무기(핵) 감축 협정(START, 1991)-핵탄두·운반수단 감축 협정(New START, 2010) 등을 통해 핵 비확산 정책이 수행됐다. 그러나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막지 못했고, 한·일 핵 개발을 금지하는 데만 성공했다. 최근 한국은 ‘NPT·확장억제’를 준수하겠다고 확약했기에 미국의 핵 정책이 변화돼도 다른 자구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지난 7월 말 진행됐던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CNI TTX)=아이언 메이스(Iron Mace-철퇴) 24’도 확장억제에 따른 핵(미군)·재래식 무기 지원(한국군)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 논의에 집중됐다.
넷째, 북핵을 대하는 국민·지식인들의 인식이 다르고, 정치·사회·軍의 환경이 각기 다르다. 더욱이 군사적 측면에선 창끝 전투력을 지휘해야 할 초급간부 계층마저 軍을 회피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입대인구는 줄었고, △정치적 포퓰리즘이 초급간부들의 지원율을 급감시켰으며, △복무환경·근무여건에 실망한 중간간부들의 엑소더스 현상도 늘어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 의하면, 지난해에 5~10년 차 간부 9,481명이 전역하였다. 단순히 지난해와 2022년도 전역률만 비교해도 24.1%가 늘어난 규모다.
다섯째, 김정은은 지난해 소위 ‘전승절’에 샛별-4(무인정찰기)·샛별-9(무인 공격기)를 등장시켰고, 1년이 지난 8월 말 새로운 자폭형 드론(Lancet-3)을 공개했다. 우리 軍은 2014년부터 반복된 북한의 무인기(이하 드론) 침투 대응에 실패하자 ‘드론봇전투단(2018)’, ‘드론작전사령부(2023)’를 창설했다. 북한이 자폭형 드론을 공개하자 폴란드산 자폭 드론을 도입하며 연말까지 전력화를 완료하겠다고 한다. 또한,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은 레이저 대공 무기(Block-1, 출력 20kw)를 실전 배치하고, 공군·수방사 등 20개 부대엔 ‘對드론 통합체계’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美 군사력이 세계 최강임은 오직 ‘승리’를 위해 정치·군사·외교 활동이 일관되고, 적합한 무기체계는 관련 분야를 융·복합적으로 개발해서다. 반면, 이들의 해군력이 약화하고 있음은 이익집단(Jones Act) 일부가 만족하는 데 그쳐서다. 위기를 타개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 “대증적 처방은 만성병자에 소화제만 처방하는 격”이다. (konas)
김성진 :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박사), (사)통일협력연합 자문위원, 경제포커스 국방전문기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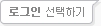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