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정전협정 61주년을 맞으며
7월 27일은 참혹했던 6·25전쟁의 포성이 멈춘 날이다. 1950년 6월 25일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6·25전쟁이 3년 1개월 2일 만에 정지된 것이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재침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에서 전쟁을 중지할 수 없다는 반론도 거셌지만, 정전협정은 많은 생명을 구했고, 대한민국 번영의 초석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7 정전협정 체결일이 제대로 기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오해와 무관하지 않다. 한국은 1954년 정전협정문에 명시된 제네바정치회담에도 참석했고, 당시 공산 진영은 한국의 참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공산 진영은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 일각에서도 정전협정문에 김일성의 서명은 있지만, 이승만의 서명은 없다는 점을 들어 한국은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널리 확산됐다.
이러한 오해는 정전협정이 국가수반이 아니라 전장(戰場)의 최고사령관에 의해 체결되는 협정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다. 김일성은 서명에 병기된 바와 같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자격으로 서명했던 것이다. 마오쩌둥이나 스탈린, 그리고 아이젠하워와 같은 국가수반의 서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서명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군 최고사령관은 왜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것은 영국군을 포함한 15개 유엔참전국 사령관들이 서명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대표로 서명했기 때문이다. 한국군은 당시 유엔군은 아니었지만 6·25전쟁 초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었다.
한국군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미 해군중장 윌리엄 해리슨과 북한 인민군대장 남일 양측 협상대표가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에 서명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에 의해 잘못 각인된 측면이 있다. 도쿄에서 날아온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문산에서 서명할 당시 최덕신 한국군 대표가 다른 유엔 참전군 대표들과 함께 참석했던 사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승만 대통령은 7월 27일 당일 오전 최덕신 한국군 대표를 경무대로 불러 정전협정 조인식에 참석하도록 지시했었다. 그리고 정전협정과 연계해 1953년 8월 8일 미국에서 날아온 덜레스 국무장관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가(假)조인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전쟁재발을 막는 국제적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당사자도 아니었던 정전협정을 기념하기보다 하루속히 평화협정에 의해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단히 계속돼야 하겠지만, 그러한 노력은 6·25전쟁과 정전협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출처 : 국방일보 7월25일 18면 ‘오피니언’
- 관련기사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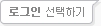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